-
아침
이른 아침부터 햇살이 암막커튼의 열어둔 틈 사이를 격하게 밀고 들어온다. 막 6시가 된 꼭두새벽의 바다가 궁금해 틈사이로 소심하게 내다본다. 어딘가에 갓 떠오르고 있을 해가 비추고 있는 남해의 하늘이 벌써부터 훤하다. 훤한 하늘 밑 바다가 고요하다. 숙소 앞에 정박해 있는 예닐곱 대의 요트가 보이고 저만치 방파제가 있고, 더 멀리 드문드문 섬들이다. 해가 덜 떠서일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도 아직 바다에 윤슬이 없다. 창밖 풍경 모든 것이 멈춰있고 고요하니 잘 찍어둔 사진 같다.
암막 커튼을 열어젖히고 침대에서 빈둥거리다가 양치와 세수만 하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겨 숙소를 나섰다. 해변까지 다녀올 요량으로 나선 이른 아침 산책길이 벌써부터 뜨끈하다.
바다를 향해 나있는 숙소의 창을 모두 열었다. 아침부터 밖에서 열기가 들어온다. 오늘도 무지 더우려나 보다.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면 해선 안될 일이지만 창문을 모두 열고 에어컨을 켰다. 신선한 바다의 아침 공기도, 널찍하고 쾌적한 이곳 숙소에서 즐기는 시원함도 모두 놓칠 수 없다. 잠시만 미련하게 에너지를 낭비해 보기로 한다.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본다.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창 끝에 걸쳐진 커튼을 살짝 건드리고 침대 끝에서 아래로 반쯤 늘어진 홑이불까지 한 번씩 툭툭 친다. 바다에는 언제부턴가 윤슬이 가득 깔렸다. 해가 제법 올라갔나 보다. 커피 한잔 있으면 완벽한 아침이겠다.
저녁
남단 끝자락에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타지에서 온 이에게 때로는 제법 큰 과제일 수도 있다. 남해에 길게 혹은 짧게 여러 번 다녀갔던 아내에게 몇 차례 들었던 것들을 막상 내가 겪으니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싶었다. 남해의 식당들은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특이하게도 수요일에 쉬는 경우가 많고, 멸치 쌈밥과 같은 남해 특유의 음식을 차려주는 식당은 혼자 밥 먹는 손님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남해에 도착한 첫날인 어제는 저녁 늦게 도착하는 통에 서둘러 숙소 근처 독일마을에 가서 대충 허기를 채웠으니 첫 저녁이라 하기는 조금 부족하고 둘째 날 드디어 남해에서 첫 저녁식사를 혼자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아내가 경고했던 수요일이다. 전에 아내와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었던 식당의 필라프가 먹고 싶어 숙소에서 꽤 먼 길인데도 꾸역꾸역 운전해 가니 수요일이라 문을 닫았다. 아예 가게 문에 이번주는 목요일까지 휴무라고 붙어있다. 금요일에 돌아갈 예정이니 이번 여정에 이곳에서 식사는 글렀다.
숙소 쪽으로 돌아오면서 맛있다는 몇몇 집에 들러보니 모두 수요일이라 문을 닫았거나 재료 소진으로 영업 종료. 숙소 가까운 곳까지 와서 들른 두 곳의 한식집에서는 1인에게 제공하는 음식이 없다고 해 발길을 돌리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안 그래도 없는 선택지가 점점 좁아져 마음이 초조해진다. 지도 앱을 켜고 주변 식당들을 찾아보아도 아직 늦지 않은 저녁인데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결국 어제 갔었던 독일마을의 식당으로 가서 굴라쉬와 독일 소시지를 포장해 숙소에 들어왔다. 늦게 도착해서 간단히 허기를 채우려 했던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저녁식사라 조금 섭섭하게 시작했지만 맛있게 잘 만들어진 굴라쉬와 독일 소시지가 섭섭함을 달래준다.
잠자기 전 아내와 통화하는데 아내가 묻는다. '오늘 행복했어?'
첫 아침의 꿀 같은 여유, 일하러 찾았던 카페, 삼천포의 수영장,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이국적인 저녁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종일 내 주변을 맴돌던 남해의 고요하고 멋진 바다.
'응, 엄청!'
하루
숙소에서 40분 정도 운전을 해서 가면 문 닫은 수영장에 위치한 ‘더 풀’이라는 수제 햄버거집이 있다. 40분이나 운전을 해야 하니 남해도 꽤 큰 섬이다. 이 집은 전에 아내와 갔던 곳인데 음식도 가게의 내부도 모두 우리 부부의 취향에 딱 맞는 곳이다. 남해에 왔으니 점심 식사는 이곳의 햄버거를 먹기로 하고 일찌감치 숙소를 나섰다.
점심 인파가 몰리기 전 첫 손님으로 주문한 햄버거를 먹고 인근에 있는 카페로 갔다. 이 카페에는 하치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 녀석 붙임성이 예사롭지 않다. 처음 아내와 이곳에 왔을 때, 그 카페 근처 둑에서 사진을 찍으며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말을 걸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예사 고양이 같지 않게 오자마자 다리에 박치기를 하며 머리를 부비고 애교를 떠는 게 마치 우리 집 고양이 녀석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는 용서해 달라고 애교를 떨 때와 비슷하다. 목에 ‘하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녀석이 이 동네 유명인사였다. 우리와 놀고 있는 동안에도 지나가던 동네 분들이 모두 하치에게 아는 척을 하며 지나갔고 하치도 그 아는 척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웬만한 친화력 좋은 강아지 뺨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에도 아내는 남해에 올 때마다 하치를 만나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으며 하치와 교류를 이어갔지만 애석하게도 나는 첫 만남 이후에는 아내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에서만 하치를 만날 수 있었다. 오늘 굳이 이 카페에 온 것은 하치를 보고 싶어서다.
카페에 들어가기 전 녀석을 처음 만났던 둑과 카페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보는데 보이지 않는다. 카페 주변에도 밥그릇과 같은 하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응? 하치 죽었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주문한 커피를 받으며 물었다.
하치 잘 있죠?
네? 누구요?
하치… 고양이요.
아… 고양이요? 전 주인이 데려갔어요.
카페 사장님이 바뀌었나 보다. 꼬치꼬치 묻지 않고 그냥 아, 그렇군요. 짧게 인사하고 카페를 나섰다. 아내에게 전화해 하치가 이사 간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이제 하치 못 보나? 아쉽다.
네비의 안내를 무시하고 돌고 돌아 멀리 해안길을 따라 숙소로 향한다. 고요한 바다 같은 하루를 보낸다.
다른 저녁
수요일을 벗어나니 남해에서 저녁 식사를 고르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날의 당혹스러웠던 기억에 일찌감치 저녁을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지도 앱을 열었는데 어제와 모든 것이 다르다. 바야흐로 식도락 남해가 지도에 펼쳐져 있다. 뚝배기나 해물 칼국수 같은,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곳곳에 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전날과 결이 다른 고민에 빠진다. 결국 선택은 부추가 잔뜩 들어간 바지락 칼국수. 사진을 보니 내가 좋아하는 부추가 커다란 국수 사발을 덮고 있고 그 아래에 신선한 바지락과 하얀 칼국수가 들어있는 모습이다. 숙소에서 15분 정도 차를 몰고 지족이란 곳으로 가 칼국수를 먹고 맛있는 김에 부추전을 한 장 포장해 숙소로 돌아왔다. 지족은 항구가 있고, 시장이 있고, 면사무소가 있는 곳이라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상당히 많다. 말 그대로 번화가. 이제 이곳의 저녁도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자신감이 생겼다.
떠나는 아침
남해에서 맞는 세 번째 아침. 오늘 이곳을 떠난다. 이번엔 지루하고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일정이었는데, 실상 그 어느 때의 여정보다도 짧고 아쉽게 느껴진다. 도착한 날부터 선글라스를 뚫고 눈을 찔러대던 햇살이 오늘은 코빼기도 안 비춘다. 흐린 바다의 풍경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답다. 어제까지 청명한 하늘과 새파란 바다를 가르던 또렷한 수평선이 오늘은 가물가물 있는 둥 마는 둥 저 멀리의 하늘과 바다를 합쳐 놓는다. 저기쯤 있겠지, 가상의 수평선을 그리며 바라보는 바다도 재미있다. 짐을 챙기고 체크아웃을 하고 신선한 해산물이 채워진 솥밥을 먹었다. 포만감을 안고 바닷가 언덕 위 전망 좋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신다. 남해를 기록한다. 하나하나 아쉽다. 이곳의 여백이 그리울 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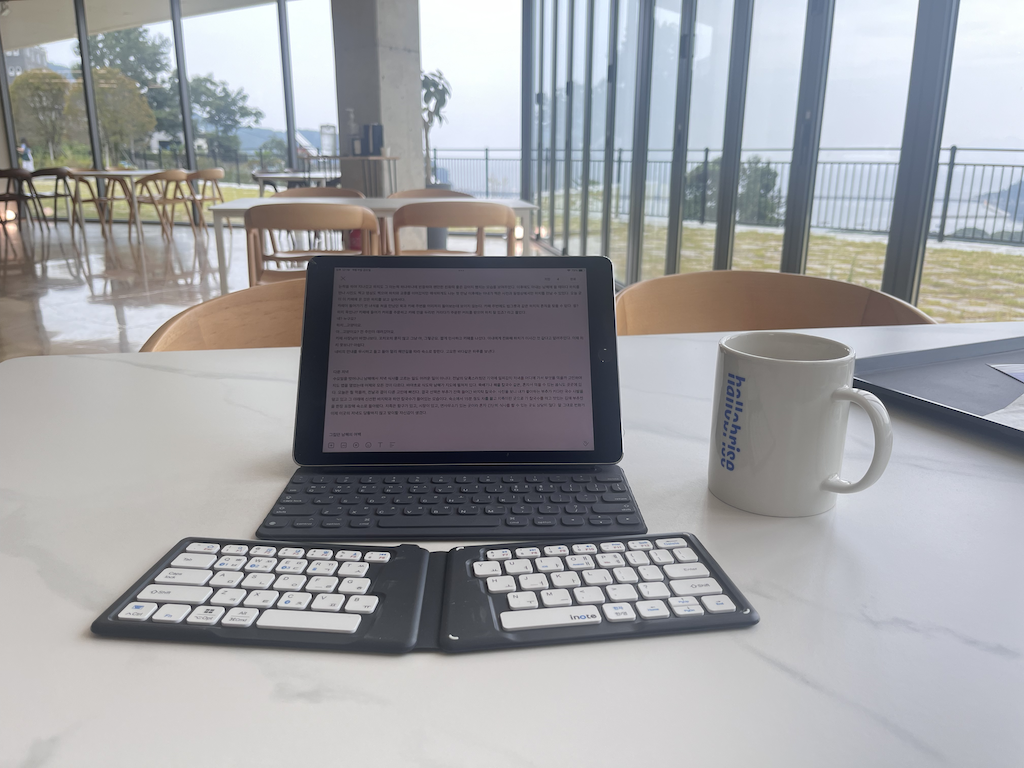
2024. 9. 6. 남해 할로브리즈 카페
'잡설 _ 배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경궁에서 하늘을 보다. (1) 2024.09.25 도쿄에서 (5) 2024.09.05